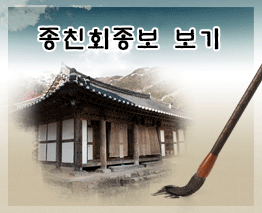육십에 다시 읽는 論語 요약하다
【육십에 다시 읽는 論語 요약하다.】
용강공파 淸岡 鄭泰鍾
1. 세상을 살면서 경계 해야할 세가지
(君子有三戒)군자유삼계
少之時 血氣未完 戒之在色
소시지 혈기미완 계지재색
乃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내기장야 혈기방강 계지재투
乃其老也 血氣旣衰 戒之在得
내기노야 혈기기쇠 계지재득
君子에게 세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
20세 이전에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女色을 경계해야 하며,
장년기에는 몸이 굳세고 단단하기 때문에 싸움을 경계해야 하고,
노년기에는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욕심 즉, 老欲을 경계해야 한다.
2.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랴
子之武城 聞弦歌之聲 夫子莞爾而笑日 割鷄焉用于刀
자(이) 지무성(하야) 문현가지성(하시다) 부자(이) 완이이소왈 할계(에) 언용우도(리오)
거문고 소리를 듣던 孔子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셨다는 말씀이 자(子)이 지무성(之武城)하야 문현가지성(聞弦歌之聲)하시다 夫子(이) 완이이소왈(莞爾而笑曰) 할계(割鷄)에 언용우도(焉用于刀)리오였다
이 말을 풀이하면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였다. 武城은 지금으로 치면 작은 지방 소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큰 나라를 다스리는 데나 필요한 예와 악을 쓰는 것은 마치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보신 것이다.
3. 먼저 道를 생각하며..
子曰 君子 謀道 不謀食 耕也 餒在其中矣
자왈 군자(는) 모도(요) 불모식(하나니) 경야(에) 뇌재기중의(요)
군자(君子)는 모도(謀道)요 불모식(不謀食)하나니 경야(耕也)에 뇌재기중의(餒在其中矣)요는...
君子는 학문과 덕행을 쌓아서 道를 먼저 달성하고자 하지 생계를 먼저 걱정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謀)는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며, 경(耕)은 농사에 힘쓴다는 말이다. 뇌(餒)는 굶주림이나 기아를 의미한다.
4. 배부름과 편안함을 생각하지 않는다.
子曰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자왈 군자(이) 식무구포(하며) 거무구안(이니라)
‘君子는 식무구포(食無求飽)하며 거무구안(居無求安)이나라’는 ‘君子는 배불러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따뜻한 잠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현대에 이르러 비리와 악행에 연루된 채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새겨야 할 대목이다.
5.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인불지이불온(이면) 부역군자호(아)
인불지이불온(人不知而不溫)에서 ‘인부지(人不知)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라는 뜻이다. 또한 ‘불온(不溫)에서 온(溫)은 성냄이나 노여움‘을 나타낸다.
6. 삶의 기본에 충실한 일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군자(는) 무본이나 본립이도생(이니라)
군자(君子)는 무본(務本)이니, ’근본이란 무엇인가?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천하를 조심하고 정치에 참여해 입신하는 것만이 근본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군자가 근본에 힘을 쓰면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하니라, 곧 도가 바르게 서게 된다.
7.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한다.
聖人 吾不得而見之矣 得見君子者 斯可矣
성인(을) 오부득이견지의(어든) 득견군자자(면) 사가의(니라)
聖人은 오부득이견지의(吾不得而見之矣)어든 득견군자자(得見君子者)면 사가의(斯可矣)니라는 이런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문구이다. 내가 살아서 아직 한번도 성인을 만나지 못했는데 성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면 군자(君子)라도 한 번 만나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군자는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사람 군자가 되는 것이다. 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군자기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군자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8. 학문에 열중하면 저절로 밥이 생긴다.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 憂道 不憂貧
학야(에) 녹재기중의(니) 군자(는) 우도(요)불우빈(이니라)
집안의 명운을 걸고 밤을 낮삼아 공부하던 이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문구가 학야(學也)에 녹재기중의(祿在其中矣)니 군자(君子)는 우도(憂道)요 불우빈(不憂貧)이니라이다.
이 구절을 풀이하면 ’學問에 열중하면 저절로 벼슬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 군자는 반드시 되는 道의 실천을 걱정하는 것이지 가난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9. 끝없이 어짊을 추구하다.
子曰 君子而不仁者 有矣夫 未有小人而仁者也
자왈 군자이불인자(는) 유의부(어니와) 미유소인이인자야(이니라)
君子로서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인이면서 어질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말처럼 孔子역시 君子가 완벽한 인격체계가 아님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君子는 비록 지금은 어질지 않을지언정 끊임없이 어질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10. 느긋하나 교만하지 않게..
君子泰而不驕 小人驕而不泰
군자(는) 태이불교(하고) 소인교이불태(니라)
군자태이불교(君子泰而不驕)하고 소인교이불태(小人驕而不泰)니라를 풀이하면, 君子는 느긋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 소인은 교만할 뿐 느긋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않되 그렇다고 너무 교만해 자만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일 것이다.
11. 마음만은 언제나 크고 단단하게..
君子 不可小知 而可大受也 小人 不可大受 而可小知也
군자(는) 불가소지 이가대수야(요) 소인(은) 불가대수 이가소지야(니라)
공자께서는 군자가 작은 일은 몰라도 큰 일을 맡아서 해결할 수 있다. 소인은 큰 일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작은 일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군자는 불가소지 이가대수야(不可小知 而可大受也)요 소인(小人)은 불가대수 이가소지야(不可大受 而可小知也)니라에서 지(知)는 알고 또 다스린다는 말이다.
* 한편 소인들은 작고 세세한 업무에 능해서 사무직이나 금전출납 같은 작은 일들을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누구 일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경중을 따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12. 미워해야 할 것도 있다.
子貢曰 君子亦有惡乎 子曰 有惡 惡稱人之惡者
惡居下流而訕上者 惡勇而無禮者 惡果敢而窒者
자공왈 군자역유오호(잇가) 자왈 유오(하니) 오칭인지악자(하며) 오거하류이산상자(하며) 오용이무례자(하며) 오과감이질자(이니라)
공자께서도 남의 잘못을 떠들어대는 것을 미워하고(오칭인지악자:惡稱人之惡者),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미워하고(오거하류이산상자:惡居下流而訕上者), 용맹하게 날뛰고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미워하고(오용이무례자:惡勇而無禮者),꽉 막혀 사리에 총하지 않는 걸 미워한다(오과감이질자:惡果敢而窒者)고 하셨겠는가
분명 미워해야할 건 있다. 그러나 신상털기와 같은 과격한 방법으로 미움을 표현한다면 미움을 받은 대상과 우리가 다른 건 무엇이겠는가.
13.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
子貢曰 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不爲也
자공왈 수소도(나) 필유가관자언(이어니와) 치원공니(라) 시이(로) 군자불위야(이니라)
비록 아주 작은 도라 할지라도(수소도:雖小道) 반드시 눈여겨 볼만한 점이 있을 것이지만(필유가관자언:必有可觀者焉) 더 원대한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치원공니:致遠恐泥)군자는 이를 배우지 않는다(시이군자불위야:是以君子不爲也)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도 있으나 큰 일에 집중하고 자질구레한 일에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군자불기(君子不器)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14. 배워서 아는 것도 좋다.
學而 知之者 次也
학이 지지자(는) 차야(요)
공자께서는 자신의 미래와 학문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배워서 익히는 학문의 길을 선택하셨다. 학이지지자(學而 知之者) 차야(次也)는 배워서 아는 것이 좋다는 공자의 뜻이 담겨 있는 문구이다.
15. 선생의 가르침을 무겁게 여겨야
子路有聞 未之能行 唯恐有聞
자로(는) 유문(이요) 미지능행(하여선) 유공유문(이니라)
子路는 유문(有聞)이요 미지능행(未之能行)하여선 유공유문(唯恐有聞)이니라에서 문(聞)은 교훈을 듣는다는 뜻이며 유공(唯恐)은 매우 두려워한다는 의미이다.
’子路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미처 실천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가르침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다‘이다.
16. 한번 잘못한 일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
孔子對曰 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공자대왈(는) 유안회자호학(하야) 불천노(하며) 불이과(이노라)
孔子께서는 안회(顏回)에 대해 불천노(不遷怒 )하노라라는 말로 평가하셨다. 불천노(不遷怒)는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말이며, 불이과(不貳過)는 한번 잘못한 일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7. 學文을 배워야 한다
行有餘力 則以學文
행유여력(이면) 즉이학문(이니라)
孔子께서는 행유여력(行有餘力)이면 즉이학문( 則以學文)이니라는 구절을 통해 모든 것을 실천한 뒤 남는 餘力이 있을 때 비로소 학문에 정진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은 학문을 위한 학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직 孝와 仁과 德을 위한 行이 있어야만 진정한 學文으로서의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는 기르침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孔子의 말씀과는 달리 돈과 지위,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통과물로 학문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18.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道千承之國 도천승지국(호대)
공자께서는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경사이신(敬事而信), 일을 성실하게 하며 말과 행동을 하나되게 해야한다. 절용이애인(節用而愛人), 나라의 세금을 소중히 사용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 사민이시(使民以時), 곧 백성을 부릴 때는 때를 맞춰 적절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지배층의 이지적인 욕심을 자제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것이 지배층이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좋은 밥법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19. 과거는 과거일 뿐..
吾少也賤 故多能鄙事
오(이) 소야(에) 천(이라) 고(로) 다능비사(호니)
오(吾)이 소야(少也)에 천(賤)이라 고(故)로 다능비사(多能鄙事)호니는 나는 어려서 미천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잘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다.
젊은 나이에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은 큰 인물이 되는데 커다란 힘이 되줄 것이다.
20. 세상에 뜻을 펼치고 싶다면..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천하유도즉현(하고) 무도즉은(이니라)
천하유도즉현(天下有道則見)하고 무도즉은(無
道則隱)이니라 즉, 천하에 道가 있으면 나타나고, 천하에 道가 없으면 숨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공자께서 말씀하신대로 학문과 벼슬이 하나의 고리로 움직이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단계를 이르는 것이다. 세상에 도가 있으면 자신이 담은 벼슬을 바탕으로 경륜을 펼치는 치인(治人)을 행하며, 세상에 도가 사라지면 다시 세상 밖으로 물러나 스스로 수기(修己)에 힘쓰는 것이다.
결국 세상에 나가는 가장 큰 기준은 도(道)인 것이다.
21. 남을 공경하되, 예에 맞아야..
恭近於禮 遠恥辱也
공경어례 원치욕야(이며)
공자께서는 공근어례(恭近於禮) 원치욕야(원치욕야)를 통해 남을 공경하되 예에 맞게 해야 한다. 그래야 치욕(恥辱)에서 멀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즉 공자께서는 남을 공경하되 그것이 예에 맞는 행동인지를 판단해서 절도있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 하다는 말이 떠오르는 구절이다.
22. 부족하지만 의연하게...
子曰 君子固窮 小人 窮斯灆矣
子曰 군자고궁(이니) 소인(은) 궁사람의(니라)
공자께서는 자로에게 하신 말씀이 君子는 고궁(固窮)이니 소인(小人)은 궁사람의(窮斯灆矣)니라였다. 이 말은 군자는 원래 궁핍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소인은 궁핍하면 문란한 짓을 하게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더 설명하면 ’군자 역시 궁핍한 때가 있다. 그러나 군자는 궁핍하다고 해서 소인들과 같이 문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진 난세였다. 그러나 공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23.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불환무위(오) 환소이립(하며) 불환막기지(오) 구위가자야(이니라)
불환무위(不患無位)오환소이립(患所以立)하며 불환막기지(不患莫己知)오구위기지야(求爲可知也)이니라는 남을 탓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면 제격인 말이다. 세상에서 벼슬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벼슬을 맡을 수 있는 바탕부터 만들어라, 사람들이 나를 몰라 준다고 서운 해 하지말고 사람들이 기억할만한 일을 먼저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건 쉽지만 다른사람이 결과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에 원망은 저 깊은 곳으로 보내고 부족한 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24. 큰 뜻에 이르는 학문의 길
子夏曰 百工居肆 以成其事 君子 學以致其道
자하왈 백공거사(하고) 이성기사(하고) 군자 학이치기도(니라)
자하왈(子夏曰) 백공거사(百工居肆)하고 이성기사(以成其事)하고 군자 학이치기도(君子 學以致其道)니라는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모든 기능공은(百工居肆) 작업현장에서 일을 성취한다(以成其事), 군자는 학문을 가지고 도를 실천한다(學以致其道).
지나치게 학문에 우위를 둔 관점일 수 있으나 다르게 보면 그만큼 학문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도 담겨있는 구절이다.
25. 때로는 너그러움도 필요하다
子夏曰 大德不踰閑 小德出入可也
자하왈 대덕부유한(이면) 소덕출입가야(니라)
공자의 뜻을 이어받은 제자 子夏 역시 대덕불류한(大德不踰閑)이면 소덕출입가야(小德出入可也)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풀이하면 忠이나 孝 같은 큰 덕목은 지키는데 한계를 넘으면 안 되지만, 작은 덕목은 지키는데 한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26.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君子 成人之美 不成人惡 小人反是
군자 성인지미(하고) 불성인악(하나니) 소인반시(이니라)
君子 성인지미(成人之美)하고 불성인악(不成人惡)하나니 소인반시(小人反是)니라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군자는 남의 장점을 도와 성취하게 하고, 남의 단점을 눌러 악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소인은 반대로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칭찬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를 살려주고, 단점을 완화시켜 주는 것, 거기서 부터 군자의 길은 시작될 수 있다.